여고생이 쓴 ‘박근혜X최순실’ 팬픽 클라스


출처 : 방송화면 캡처 및 네이트 판
갈 때까지 갔다. 하다 하다 이제는 최순실 팬픽까지 등장했기 때문.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라온 게시물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ID는 ‘근실뽀에버’, 느낌이 오는가.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소재로 한 ‘팬픽’인 것.
청와대, 해외순방, 곰탕, 오방색 등 최근 언론에서 쏟아진 많은 이야기들을 풍자하는 듯 자연스레 녹여낸 여고생의 필력에 누리꾼들은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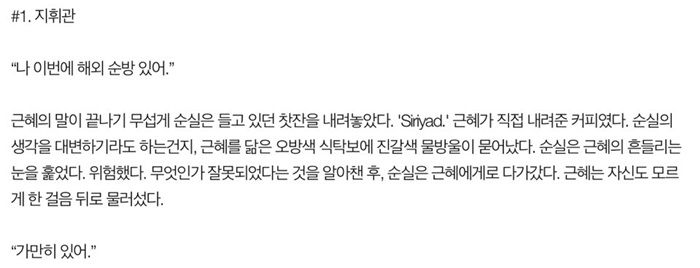
▲ 팬픽 일부
“재판하는 존경장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판춘문예. 2탄이 얼른 보고 싶네요”
“근데 순실씨가 근혜씨보다 동생이에요”
“글빨 어쩔 거임. 왜 이렇게 잘 씀? 너무 잘 써서 감탄스러우면서도 진짜 기분 그지 같아지는 신기롭고 오묘한 체험”
해당 팬픽이 화제가 되자 이를 올린 여고생은 자신의 친구가 무심코 쓴 글이 너무 웃겨서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또한 내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언니인 건 알지만 최순실씨가 더 실세라서 (소설 중)언니라고 표현했어요. 문학적 허용이라고 봐주세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가 2탄 쓸 생각이 있긴 한데 선뜻 올리기 두렵대요. 팬픽을 처음 써보는 거라는데… 이 친구 공무원이 꿈이라는데 진로방해되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요”라고 말했다.
다음은 팬픽 1탄 ‘지휘관’ 전문이다.
#1. 지휘관
“나 이번에 해외 순방 있어.”
근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실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Siriyad.’ 근혜가 직접 내려준 커피였다. 순실의 생각을 대변하기라도 하는건지, 근혜를 닮은 오방색 식탁보에 진갈색 물방울이 묻어났다. 순실은 근혜의 흔들리는 눈을 훑었다. 위험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챈 후, 순실은 근혜에게로 다가갔다. 근혜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만히 있어.”
늘 순실은 근혜에게 지시를 내렸다. 근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연스레 순실만을 _았고, 순실의 지시는 곧 근혜의 숨결의 이유였다. 순실이 근혜의 바로 앞에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지켜보는 이가 있다면, 숨도 못 쉴 정도로 가깝고도 묘했다. 근혜의 표정은 출소를 앞둔 이의 얼굴처럼 상기되어 보였다. 그런 근혜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순실은 누구보다 여유로웠다.
“나, 따라갈 거야.”
“어디를? 순방?”
“어.”
“언니 근데..”
“내가 결정해.”
순간, 정적이었다. 순실의 표정은 단호했다. 근혜 또한 순실에게 다시 한 번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다. 순실을 사랑하기에, 뒤따라가고 싶기에 자존심은 접어놓아야만 했다. 그녀는 이미 순실의 꼭두각시였다.
순실과 근혜는 청와대 밖으로 나왔다. 근혜의 순방 이틀 전이었다. 근혜는 순실을 만날 때면 경호원들을 떼어놓곤 했다. 순실만으로 이미 그녀를 둘러싸기에 충분했다. 순실은 여느 때처럼 근혜의 손에 먼저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근혜는 놀란 눈을 하고 순실을 쳐다보았지만 순실은 그런 근혜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그녀만의 대화법이었다. 금세 봄바람이 둘의 이마를 간지럽혔다. 겨울에 태어나,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차디 찬 기운을 품은 순실이지만, 봄바람에 미소 짓는 근혜를 보고 실소를 참지 못했다. 순실의 눈에 비춰진 근혜는 그저 순수한 어린아이였다. 순실이 항상 뒤에서 근혜를 도와주는 것의 이유이기도 했다.
“근혜야.”
“응?”
“기억나?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
“아…기억나지..뚜렷하게..”
최태민. 순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였다. 순실은 그를 존경했고, 가치관을 사랑했다. 그리고 태민은 순실의 친한 동생이었던 근혜를 매우 아꼈다. 사실 이들의 인연은 한 편의 소설과도 같이 편지 한 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4년 8월 15일, 근혜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 발의 총알로 인해 힘없이 죽어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근혜는 말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또 물조차 마시는 것이 힘겨웠다. 그런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최태민. 그 편지는 곧 근혜를 태민과 순실에게 빠져들도록 바라보고만 있는 방관자인 셈이었다.
“그 때 나 많이 울었는데..”
“맞아. 근데 갑자기 왜? 날씨도 좋고, 나쁜 일도 없고. 돌아가실 때 말고 살아계실 때 생각해.”
“그래야겠지. 이럴 때 보면 애는 아닌 것 같네.”
“그래도 나, 언니 없으면 안 돼. 언니, 우리 밥 먹자. 곰탕 어때?”
“곰탕? 좋다.”
순실과 근혜는 벚꽃 잎들이 흩날리는 뜰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근혜는 순실보다 왜소한 체격에 항상 순실의 걸음에 이끌리듯 했다. 근혜의 작은 발이 순실의 그림자와 살아있는 풀들을 밟았다. 순실은 근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둘의 눈이 마주치자 순실은 걸음을 재촉했다. 왠지 빨리 들어가 앉아 근혜와 더 말을 나누고 싶었다. 근혜의 일을 더 도와주고 싶었다. 그 때, 순실의 볼 위에 차가운 것이 내려앉았다.
“비 온다, 언니!”
서울 하늘 아래 청와대에 내리는 봄비를 함께 맞는 둘이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